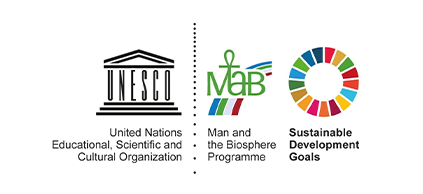남북한은 정치적으로 대화 국면일 때 오히려 접경지역은 생태적 위기를 맞곤 했다. 특히 한강하구수역은 골재채취 등의 개발사업으로 심각한 서식지 소실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DMZ 지역은 도로와 철도사업이 추진되었고, NLL일원은 어업불가 지역을 개방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히려 정치적 경색국면에 비정치적인 생태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강하구수역의 습지구간을 남북한 공동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이다. 현재 한강하구 남측에는 고양시 장항습지에서부터 강화군 북단 갯벌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중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도 등록되어 있다. 당사국들이 공동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려면, 각자가 람사르습지를 등록하고 공동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북한은 라선과 문덕을 람사르습지로 등재한 이후 추가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남북한의 접경이면서 한강하구수역의 북한쪽 연안인 용연군~배천군연안을 중요습지보호지역으로 등재했다. 그러므로 한강하구습지 북측구간을 국제 공동조사를 통해 람사르습지로 등록한다면 이후 한강하구 접경 람사르습지 등록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람사르습지와 EAAP 네트워크 지역 간 자매결연 활동이 가능하다. 한강하구를 공동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동시에 EAAFP 네트워크 지역으로 등재된 장항습지와 문덕습지 간 자매습지(sister wetland) 맺음을 통해 남북 간의 환경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당장이라도 두 지자체가 제안하고 남북한 당사국들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 특히 EAAFP와 국제재단인 한스-자이델재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문덕습지에서 '물개리축제'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실현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금야철새보호구와 철원평야는 모두 EAAFP네트워크 지역에 가입되어 있으며 두루미 서식지이므로 두 지역간 자매결연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록은 통일은 당장 어렵더라도 남북의 습지를 오가는 철새들을 통해 습지 보전 협력은 가능할 것이다.